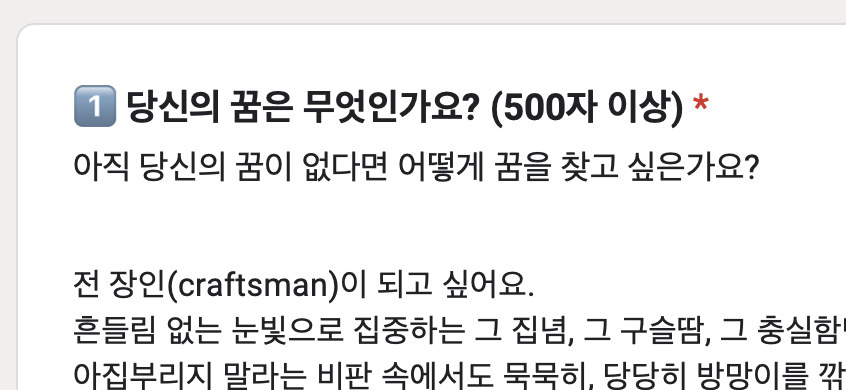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집중하는 그 집념, 그 구슬땀, 그 우아한 충실함만으로도 전 설레요.
아집부리지 말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당당히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되는게 제 꿈이에요.
전 공학도이니 "기술을 깎는 노인"이 되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요.
사실 공학 자체에 깊은 애정은 없어요. 당연히 대학생활도 그리 즐겁지는 않았고요. OS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로직 게이트 별 진리표는 이러하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래서 빠르고, 다 누군가의 멋진 발명품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그래서 내가 이걸 왜?"에는 답을 주지 못해요. 그 자체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과,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인문학과는 달라요. 있는 그대로의 공학은 공허해요.
하지만 공학의 연료가 내재적 동기로 채워지는 순간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UOM | COMP12111 | LightCatcher - 이건 제가 난생처음 만들었던 게임이에요. 파이썬도, 자바도, C도 아니고, 무려 어셈블리 코드로, 레지스터를 한땀한땀 깎으면서 짠 게임이에요. 그 차디찬 어셈블리도, 제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제 가슴을 지피더군요. 1주일을 밥만 먹고 저 게임만 만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계산기를 짜고 있을 때, 전 예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산출물을 진심으로 즐기는 친구들의 미소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이때부터 꿈이 시작됐다"는 소년만화를 쓰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때를 기점으로 차가운 공학과 뜨거운 자아실현의 화학반응에 재미를 붙인건 맞아요.
제 관점에서 그 재미의 정점을 찍은, 그렇기에 제가 존경하는 장인은 켄 코시엔다(Ken Kocienda)에요. 첫번째 아이폰의 쿼티 키보드를 발명한 엔지니어에요. 당시의 대세는 블랙베리였고, 모두가 하드 키보드의 정확함에 익숙했어요. 때문에 아이폰은 “터치스크린으로 이메일 하나 보낼 수 있겠어?”하는 의문에 답해야했어요. 안그래도 작은 키를 가리는 엄지가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는 바람에 정확도가 형편없었거든요. 코시엔다는 이 문제를 우아한 발명으로 풀었어요. 마르코프 체인을 활용해 맥락에 따라 키의 크기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했거든요. 가령, 정관사 The를 입력하기 위해 T를 누르면, H의 크기가 살짝 커져요. H까지 입력했다면 E의 터치영역이 비대해져요. 인공지능이 사전확률로 "넛징"해줌으로서 오타를 획기적으로 보정할 수 있었어요.
그의 저서 Creative Selection을 읽어보면 이는 하루아침에 떠오른 영감이 아닌, 수없이 깎고 깎아서 완성한 "방망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첫 시도는 천지인 키보드와 비슷했어요. 두번째에선 그룹화된 쿼티를 시도하지만 세번째에선 쿼티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해요. 네번째에 이르러서야 넛징 알고리즘에 대한 윤곽이 잡혀요. 수달에 걸쳐 고치고 고민하고 고치고 고민하는 그 구슬땀이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 결과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한 기술이었어요.
저는 저이기에 저만의 길을 찾아야해요. 하지만 종착역은 켄 코시엔다의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몇달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전에 없던 우아한 창조물을 빚어내는걸 낙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꿈이 꿈인데엔 이유가 있어요.
재능의 유무는 차치하고, 장인정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학원에서 장인정신을 추구하면 와닿지 않고, 대기업에서 장인정신을 추구하면 무시당하고, 스타트업에선 장인정신을 추구하면 안되고, 예술가가 되기엔 궁핍해지니까요.
몇달이고 흔들리지 않을 명분을 제시해주고, 창조의 비선형성을 기다려줄 여유가 있으며, 그렇기에 같은 문제에 오랜기간 몰입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우물을 파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찾게된 문제가 바로 "곡선의 무릎 딜레마"에요.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만, 지수함수도 초기에는 선형함수와 비슷하게 진행되요. 그러다가 어느시점, 소위 "특이점"이라 부르는 시점을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돼요. 바로 그 지점을 "곡선의 무릎"이라 부르는데, 과거의 데이터는 선형적 발전 밖에 없었으니 여기에 서있으면 미래에 대한 직관또한 선형적일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올 것이란걸 알아도, 그렇기에 그만한 조처가 필요함을 인지는 해도, 쉽사리 행동하기 힘들어요. 뛰어내리더라도 저 밑에 물은 보여야 뛰어내리지,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뛰어내리는건 쉽지 않으니까요.
너무나도 명확한 딜레마에요. 초지능이 출현할 때까지,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모두가 안고가야할 문제에요.
이 우물이라면, 여유도, 몰입도, 효용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
19th of Nov 2025
How 보다는 What, Why를 추구하면서 살다보면 이 세상이 How는 어떻게든 제 앞에 방법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으면서 살아가요 (적어도 저는!). How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What이 아니거나 What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해져있더라고요. <넉살좋은 철학가의 조언>
어떻게?는 사실 갈피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목표와 철학을 천명하고, 상기하며, 굽히지 안고 부단히 살아가다보면
그 방법은 세상이 제 앞에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란 관용구가 괜히 있지는 않을거에요.
그렇기에 전 어떻게든 곡선의 무릎 딜레마를 풀게 될 것이에요.
장인이 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
.
.
3rd of Decembe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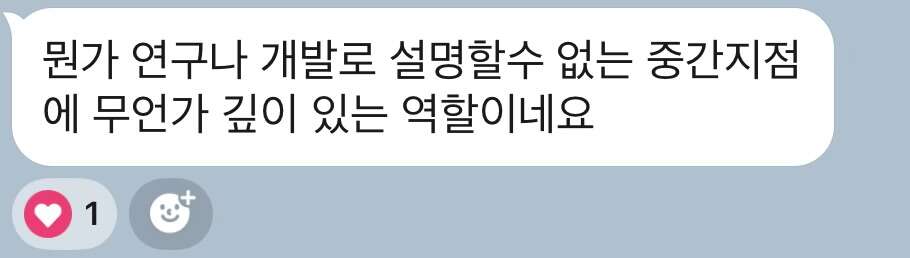
맞아요. 다이너마이트를 깎은 알프레드 노벨, 에어컨을 깎은 윌리스 캐리어, 먼지봉투없는 청소기를 깎은 제임스 다이슨, 모바일 키보드를 깎은 켄 코시엔다, LLVM을 깎은 크리스 래트너, 라이젠을 깎은 짐 켈러. 이를테면 이들이 제가 꿈꾸는 “기술깎는 노인”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연구자”는 아닐거에요. 진리의 확장보다도 당대의 효용을 추구한 분들이니까요.
그렇다하여 이들을 “개발자”로 분류하기엔, 이들은 효용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발명에 의한 전진을 원했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의 행동양식을 영구히 바꿔놓는 장치를 기어이 고안해냈어요.
장인보단 발명가란 호칭이 더 어울리려나요?
연구나 개발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결코 얕지는 않아요. 연구와 개발의 골디럭스 존을 어줍잖게 찾는건 아닌거에요. 둘의 매력만을 취한,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에요.